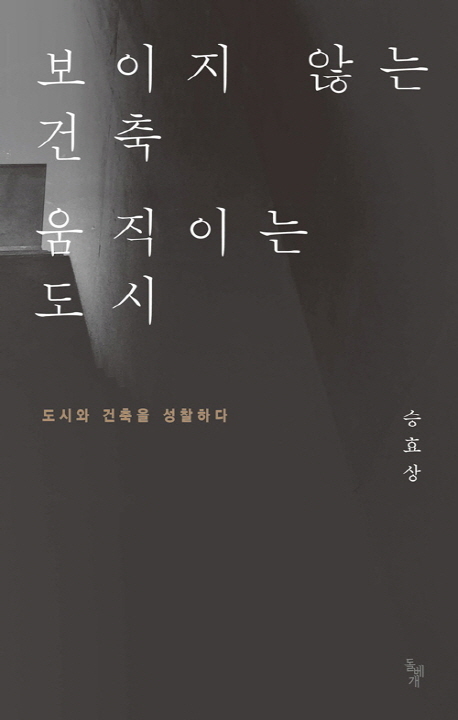
승효상씨의 책이다.
책을 볼 때는 몰랐는데 출판사가 돌베개네.
솔직히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그냥 건축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그런데
이 책은 건축에 대한 책이 아니었다.
건축을 소재로 한 제대로 된 인문학 책이었다.
우리는 흔히 '건축'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이 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조화까지 생각하고 계셨다.
그 밖의 개념도 있고.
돌베개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저자소개, 목차 다 생략한다.
----------------
책 속으로
건축가는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고유 직능으로 한다. 그 직능은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사색과 성찰을 수반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타자화하고 객관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1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추방하는 자’에서)
마스터플랜의 허망함을 아는 해외 선진도시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도시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필요한 작은 부분을 개선하고 기다리며 변화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형식, 시간이 걸리지만 시행착오 없는 이 지혜로운 방식을 침술적 방법이라고 이름했다. 도시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생물체처럼 늘 변하고 진화한다는 이치를 터득한 이 도시침술은 예산도 많이 들지 않지만, 무엇보다 과정이 민주적이고 흥미진진하다. 특히 개발이 아니라 재생이라는 지금 시대의 가치와 부합한다.
( ‘4 마스터플랜의 망령’에서)
건축가들이지만 도시에서 정작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건축이 아니라 그곳의 생생한 삶이다. 그들은 현대의 첨단 건축이 즐비한 강남을 피해 강북의 골목길 풍경에 탐닉한다. 통행 기능만 있는 직선이 아니라 지형과 경사를 따라 불규칙하게 조직된 서울의 골목길에서 그들은 건축의 지혜와 영감을 얻는 것이다.
( ‘5 내 친구의 서울은 어디인가’에서)
- 내가 그래서 강남을 싫어한다. 대로변에는 큰 빌딩이 즐비하지만, 그 안쪽에는 빌라, 원룸촌
오래 산 부부는 닮는다고 한다. 서로 달리 살던 사람들이 결혼하여 한 공간에 같이 살면서 그 공간의 규칙에 따르다 보면, 습관과 생각도 바뀌어서 결국 얼굴까지 닮게 된다는 것이다. 수도사들이 산간벽지의 암자나 수도원을 굳이 찾는 이유가 그 작고 검박한 공간이 자신을 번뇌에서 구제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 오래 걸리고 더디지만 건축은 우리를 바꾼다. 즉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좋은 건축 속에서 살면 좋은 삶이 되고, 나쁜 건축에서는 나쁘게 된다는 것. 이게 맞는다면, 건축을 통해 인간을 조작하는 일도 가능할 게다. 그래서 옛날부터 절대권력을 가진 자가 건축을 통해 대중의 심리와 행동을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고대에는 신전과 피라미드 등을 지어 민심을 장악했고, 이후 궁전이나 기념탑 같은 건축물도 절대권력의 영광을 칭송하게 하는 도구로 지어졌다.
( ‘14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에서)
- '신전과 피라미드'......
광화문에서 보면 저 위로 보이는 푸른 기와집이 보이는가
어쩌면 이런 포촘킨파사드가 우리가 사는 현대도시의 전형적 모습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강남의 대로들을 가보라. 대로변에 즐비한 고층 건물의 화려한 파사드, 그 위에 명멸하는 네온사인과 불빛……. 욕망의 풍경이 만드는 환상으로 우리는 그 꺼풀 뒤의 실제 풍경을 쉽게 잊고 만다. 그러나 뒷길에만 들어가면 앞의 소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박한 풍경이 전개된다. 집 장수들이 만든 주택과 거친 입면의 소형 건물, 그 사이의 좁은 길……. 사실은 이런 속살의 풍경이 이 도시의 진실인데도 질박함이 싫다 하여, 주요 가로변은 죄다 근린상업지구로 지정하고 고층의 상업 빌딩으로 가렸다. 우리가 살고 걷는 거의 모든 대로가 그러하니, 어쩌면 완벽한 포촘킨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게다. 겉살과 속살이 다른 도시, 우리는 그래서 늘 떠도는 삶을 사는가
( ‘21 ‘포촘킨파사드’와 도시의 속살’에서)
- 아... 이건... 나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다. 이 포촘킨이 설마 포템킨?
맞다 바로 그 포템킨.
책에서는 '<전함 포촘킨 Bronenosets Potemkin>'으로 소개하고 있다.
물론 영문으로 읽으면 '포템킨'이 맞는데
러시아어로도 '포템킨'인가?
나는 러시아어를 몰라서 모르겠다.
물론 저 영문도 러시아 글은 아니지만.
이 분이 독일어권에서 공부를 하셔서 저걸 '포촘킨'으로 읽는 건지
내 어학능력이 딸려서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수많은 영화 관련 서적에서는 '포템킨'으로 나왔던 것이 '포촘킨'이 맞는건지 궁금해졌다.
아시는 분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건축에 시간의 때가 묻어 윤기가 날 때, 그때의 건축이 가장 아름답다고 나는 즐겨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남루했어도, 거주인의 삶을 덧대어 인문의 향기가 배어나는 건축은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경이롭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건축은 건축가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거주인이 시간과 더불어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물론, 건축이 거주인에 의해 완성된다고 해서 건축가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축가는 모름지기 그 건축이 담아야 하는 시간을 재는 지혜를, 그 풍경의 변화를 짐작하는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그런 건축가가 만드는 건축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기 마련이며, 그렇지 못하면 시간을 견디지 못해 소멸되거나 우리 환경의 일부가 되기 위한 비용이 만만찮게 든다. 그래서 애초에 건강한 건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24 이 집은 당신 집이 아닙니다’에서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서) 더 북 오브 젠탱글 (리뷰) (0) | 2021.12.16 |
|---|---|
| (도서)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리뷰) (0) | 2021.12.16 |
| (도서) 세상을 판단하는 세가지 틀 (리뷰) (0) | 2021.12.15 |
| (도서) 모두 거짓말을 한다 (리뷰) (0) | 2021.12.08 |
| (도서) 분노하라 (리뷰) (0) | 2021.12.08 |




댓글